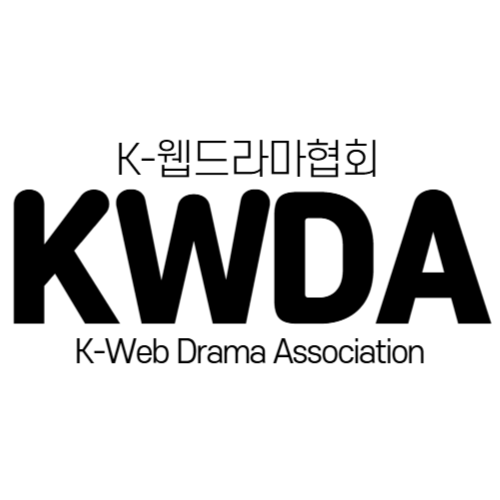상세 컨텐츠
본문
목차
프롤로그: K-드라마 전성시대, 웹드라마가 마주한 현실
2. 투자자는 왜 웹드라마에 지갑을 닫았나?

투자자는 왜 웹드라마에 지갑을 닫았나?
― 짧은 러닝타임, 작은 수익, 그리고 불안한 회수 구조 ―
OT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웹드라마 업계는 투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신선한 아이디어와 짧은 호흡으로 ‘스낵컬처’의 중심에 섰던 웹드라마는 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걸까.
1. ‘저예산=저수익’이라는 공식
웹드라마는 대체로 제작비가 수천만 원~1억 원대에 불과하다.
제작비가 적으면 손익분기점이 낮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국내 플랫폼 편성료만으로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
OTT 독점 계약이나 해외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박 가능성’이 적은 시장에 모험을 걸기 힘들다.
2. 성공사례의 편향
웹드라마 성공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작품들은 대개 플랫폼 직영 제작이거나, 대기업·대형 MCN이 관여한 경우가 많다.
이는 독립 제작사 입장에서 따라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작품이 잘 만들어져도 플랫폼 메인 노출이나 마케팅 지원이 없으면 시청자에게 닿기 힘들고, 그 결과 흥행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3. OTT의 선택과 집중
대형 OTT는 현재 ‘글로벌 대작’ 중심으로 콘텐츠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한 작품에 수십억~수백억 원을 투입해 해외 구독자 확대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발성·저예산 웹드라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심지어 단편·중편 웹드라마는 OTT의 정식 편성 리스트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4. 광고·PPL 시장의 변화
한때 웹드라마는 브랜드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PPL 무대였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숏폼 콘텐츠,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더 즉각적인 전환효과가 있는 채널로 눈을 돌리면서, 웹드라마 PPL 수익도 줄어들었다.
이는 곧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5. 해법은 ‘투자 구조의 재설계’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작사·플랫폼·투자자가 모두 새로운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 팬덤 커뮤니티 기반 크라우드펀딩: 시청자가 직접 초기 제작비를 지원하고, 굿즈·오프라인 이벤트로 수익 다각화
- 해외 니치 마켓 타깃팅: 특정 문화·장르 팬층을 위한 맞춤형 작품 제작
- 로컬 브랜드 협업: 지역 스토리와 로컬 비즈니스를 결합한 PPL 구조
웹드라마는 자본의 논리에만 기대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유연한 기획, 팬덤 중심의 제작 방식, 그리고 지역·문화적 차별화를 통한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
다음 화에서는, 이렇게 자본의 외면을 받는 웹드라마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AI 기술’이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화: AI, 친구인가 적인가〉에서 이어집니다.
'KWDA FOCU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시대, 웹드라마의 생존 전략 5회] 지역 기반 스토리텔링의 부상 (0) | 2025.08.14 |
|---|---|
| [AI 시대, 웹드라마의 생존 전략 - 프롤로그] K-드라마 전성시대, 웹드라마가 마주한 현실 (1) | 2025.08.12 |
| [AI 시대, 웹드라마의 생존 전략 4회] AI가 못하는 것 – ‘진정성’의 힘 (0) | 2025.08.12 |
| [AI 시대, 웹드라마의 생존 전략 3회] AI, 친구인가? 적인가? (0) | 2025.08.12 |
| [AI 시대, 웹드라마의 생존 전략 1회] OTT 황금기, 웹드라마의 사각지대 (2) | 2025.08.12 |